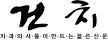유은경은 충청도 산골에서 태어나 자랐다. 아버지에게 받은 DNA덕분에 자연스레 산을 찾게 되었고 산이 품고 있는 꽃이 눈에 들어왔다. 꽃, 그 자체보다 꽃들이 살고 있는 곳을 담고 싶어 카메라를 들었다. 카메라로 바라보는 세상은 지극히 겸손하다. 더 낮고 작고 자연스런 시선을 찾고 있다. 앞으로 매달 2회 우리나라 산천에서 만나볼 수 있는 꽃 이야기들을 본지에 풀어낼 계획이다.
- 편집자 주

쑥부쟁이, 쑥부쟁이, 쑥부쟁이… 이 익숙하고도 낯선 이름을 소리내 읊조리면 입술이 매끄럽게 움직이지는 않으나 입속에 머무는 향은 부드럽다.

‘쑥’ 안에 버무려져 있는 풀내음 때문일까? 아니면 들기름에 조물조물 무친 나물의 맛이 살아나서 그럴까? 한 움큼 꺾어들고 동생과 뛰어놀던 고향 들판이 눈앞에 선명하다.

국화과의 꽃들은 매개 곤충을 유인하는 역할을 맡은 혀꽃(설상화)부분과 꽃차례 안쪽 씨앗이 맺히는 대롱화(통상화, 관상화)부분으로 나뉜다. 혀꽃은 헛꽃이고 열매를 맺는 대롱화가 참꽃이다.

‘쑥 캐는 대장장이 딸’에 얽힌 이야기도 꽃전설이 늘 그렇듯 꽃빛만큼 가련하다. 흰색에 가까운 연한 보라색의 여리여리한 꽃은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고 아주 소박해 보이지만 볼수록 매력만점인 들국화다.

여름 끝자락부터 늦가을까지 피어있는 산과 들녘의 연보라빛 비슷비슷한 꽃들을 뭉뚱그려 그저 ‘들국화’라고만 불렀었다.

쑥부쟁이와 구절초를 구별하지 못해 자책하는 어느 시인의 독백이 온몸으로 공감되던 때도 있었다. 지금은 구절초만이 아니라 개쑥부쟁이, 갯쑥부쟁이, 까실쑥부쟁이를 구별하고 멸종위기인 단양쑥부쟁이를 보고 싶어하는 꽃매니아를 자처하지만 안개 속같이 아련한 그 이름 ‘들국화’를 버리고 싶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