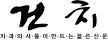유은경은 충청도 산골에서 태어나 자랐다. 아버지에게 받은 DNA덕분에 자연스레 산을 찾게 되었고 산이 품고 있는 꽃이 눈에 들어왔다. 꽃, 그 자체보다 꽃들이 살고 있는 곳을 담고 싶어 카메라를 들었다. 카메라로 바라보는 세상은 지극히 겸손하다. 더 낮고 작고 자연스런 시선을 찾고 있다. 앞으로 매달 2회 우리나라 산천에서 만나볼 수 있는 꽃 이야기들을 본지에 풀어낼 계획이다.
- 편집자 주

들꽃 이름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 중 하나이다. 칡덩굴이나 댕댕이덩굴 줄기와는 달리 ‘사위질빵’은 잘 끊어지고 약하다. 처갓집 일을 도우러 온 사위에게 그 줄기가 견딜 만큼만 짐을 지워 나르게 하려는 장모의 배려와 위트가 담겨있는 이름이다.

한여름, 나무를 타고 올라가 눈송이처럼 솜털처럼 하얗게 피어 있으면 사위질빵이다. 나무는 물론 담장이나 울타리,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의지해 맘껏 햇볕을 받으며 꽃을 피운다.

양지녘이면 어디든지 좋다. 숨어서 피질 않는다. 꽃잎은 없고 꽃처럼 보이는 4장의 꽃받침과 많은 암술, 수술이 덩이져 있다.

털이 달린 긴 암술대가 뭉쳐 있는 열매는 바람을 타고 날아가기에 알맞게 생겼다. 미처 날아가지 못한 열매들은 한여름에 피어난 꽃송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추운 한겨울을 나고 있다.

좁은잎사위질방, 좀사위질빵도 있고 약효가 많아 두루두루 쓰임이 많다. 5월에 꽃이 조금 더 크게 피는 ‘할미밀망’과 참 많이 닮았다.

짐도 조금씩 나르게 하고 씨암탉도 잡아주는 장모의 사랑이 떠올라 웃음 짓게 하는 꽃인데 시아버지나 시어머니의 며느리 사랑이 배어있는 꽃이름은 없는 걸까?

며느리밑씻개, 며느리배꼽, 며느리밥풀… 관계의 따스함보다는 고된 시집살이가 스며든 꽃이름이 먼저 떠오른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한 남자를 사이에 둔 여자와 여자! 달라진 세태이고 세대이나 한 가족으로서 안고가야 하는 숙제로서의 무게는 여전한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