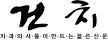유은경은 충청도 산골에서 태어나 자랐다. 아버지에게 받은 DNA덕분에 자연스레 산을 찾게 되었고 산이 품고 있는 꽃이 눈에 들어왔다. 꽃, 그 자체보다 꽃들이 살고 있는 곳을 담고 싶어 카메라를 들었다. 카메라로 바라보는 세상은 지극히 겸손하다. 더 낮고 작고 자연스런 시선을 찾고 있다. 앞으로 매달 2회 우리나라 산천에서 만나볼 수 있는 꽃 이야기들을 본지에 풀어낼 계획이다.
- 편집자 주

이리저리 둘러봐도 계곡을 건널 방법이 없어 신발을 벗어들었다. 물은 아직 차가웠으나 몸으로 전해지는 기운은 상쾌했다. 물의 자정능력이 꽃을 찾아든 나그네에게도 통했는지 멀고 낯선 길, 운전의 피로가 단숨에 날아갔다.

귀룽나무 꽃비가 내리는 그 계곡에 들어서니 농익어가는 푸르름에 멀미가 났다. 다시 신발을 신고 몇 걸음 옮기지 않아 하얀 꽃잎이 내려앉은 넓적한 잎에 보라색 꽃 몇송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당개지치’와 마주쳤다.

사진으로만 보아오던 꽃의 실물과 맞닥뜨리는 순간은 정말 만감이 교차한다. 꽃모양과 색깔, 잎이나 전체의 크기와 생김새는 그 곳의 햇살과 바람, 기분까지 재입력을 해야 해서다.

4~5월, 봄의 한가운데서 꽃을 피우고 중부 이북 산에서 살고 있다. 아쉽게도 남쪽에서는 볼 수 없는 모양이다. 지치의 인삼모양 자주색 뿌리는 약초로 쓰이고 자주색 염료로도 쓰이며 이른 봄에 돋는 어린 순은 양념 필요 없는 나물로 유명하다.

뿌리에 색소가 없어 염료로는 쓰이지 못해 ‘개’지치이고 중국에서 들어와 ‘당’개지치이다. 지치와 개지치, 당개지치 외에도 바닷가 모래에 사는 ‘모래지치’, 양지바른 곳에 파랑색 꽃이 피는 ‘반디지치’, 북쪽의 땅에 있어 아직은 만날 수 없는 ‘왜지치’와 ‘뚝지치’가 있다.

그 계곡에는 적당한 차분함과 끝없는 고요가 가득차 있었다. 하지만 적막함이 다가 아니어서, 고맙고 쓸쓸함이 전부가 아니어서 참 다행인 꽃길이었다.

물위에 떠있는 꽃잎 위에 같이 흘려보낸 것이 시간만은 아니었으니 발걸음 할 때마다 한시름씩 가벼워져 돌아올 만큼 넓지 않으나 넉넉한 품이었다.

날은 잔뜩 찌푸리고 으스스한 추위가 소매 속으로 파고드는, SF영화 속 저주받은 도시와 같은 요즘 5월의 그 계곡과 그 맑은 물소리가 더없이 그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