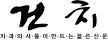이 글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서울경기지부 2007 가을 소식지에 기고한 글의 전문이다.(편집자)
어릴 때 작업(?)할 때 쓰는 표현이 있었다. ‘나 닮은 아기가 아장아장 기어와서 아빠가 신문보고 있는데 무릎 잡고 기어오르면 얼마나 귀여울까!!’
가정적인 사람으로 보이고자 했던 멘트… 뭐 꼭 뻐꾸기는 아니더라도 일말의 바람을 가지던 풍경이었다. 근데 지금은 내가 책보고 있으면 후다닥 뛰어와서 아빠 쉬! 하고 오줌을 싸 제끼고 책을 뒤집어 놓는다… 에구 머리야…
첫째 아이가 이제 23개월 이고 둘째아이는 아직 엄마뱃속에 있어 2달 후면 세상을 구경한다.
솔직히 온전히 기쁘지는 않다. 뒤에 끌리는 두려움. 얼마나 힘들까… 새 생명을 얻는 것에 경건한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여야 옳겠지만 솔직히 왕부담이다.
예쁘게 커가는 모습이 행복하기도 하고 기적을 보는 거 같기도 하지만 웬수가 하나 더 늘어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드는 생각은 ‘또 얼마나 아내와 싸울까’ 좀 쌩뚱 맞나?
초보아빠로 경험이 짧아 뭘 알겠냐마는 대략 2년, 아니 첫째 아이 임신 때부터 대략 3년의 육아 기간을 되돌아보면 가장 힘든 부분은 아내와 마음이 맞지 않고 다툴 때가 아닌가 한다.
아이 때문에 몸이 힘들고 개인적인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하는 것들은 아이가 한번 방긋 웃으면 게임 끝난다. 그런데 아내와 말다툼 한번하면 ‘내가 왜 이러고 살지?’ 하는 정체불명의 괴로운 화두가 떠오른다. (뭐 내가 성격이 좀 그렇다. 인정)
그렇다고 큰 문제로 싸우는 것도 아니다. 아예 큰 사고(?)치면 뭐 관계가 확실해지니까 (한사람은 빌고 한사람은 팔짱끼고 돌아 안고) 해결이 되는데 서로에 대한 짜증스러운 표정이나 말 한마디면 ‘확’하고 불화가 일어난다.
‘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나도 노력하고 있어, 난 노는 줄 알아? 나도 할 만큼 한다고!' 끝이 없다. 이런 식으로 서로 삐치면 참 서로 힘 빠지기 전에는 다가가기 힘든 상황.
이러다가 조금씩 마음을 접고 기대를 버리고 매번 싸우면서 신경을 꺼버리면 마침내 1시간씩 차를 타고 가도 말 한마디 건네기도 귀찮아하는 부부가 되는 건 아닌지 문득 걱정이 된다. 그러나 이런 걱정에 ‘나만 이해해 달라고 조르고 있구나’라고 느껴 마음을 다독이다가도 ‘우씨 왜 나만 이런 걱정해~’로 바뀌어버린다. 참…
내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런 불화는 밑에 깔린 게 ‘외로움’ 이란 생각이 든다.
아이를 낳고 이전과는 다르게 형성된 관계에 적응하지 못해서 생긴 외로움. 나만 바라보다던 아내는 이젠 내가 안중에도 없고 그래서 삐친 나는 기회만 되면 밖에서 위안 받으려 하고, 밖으로 도는 날 보고 아내는 힘들고 외로워서 윽박지르고.
‘우리 마누라가 마음이 지치고 몸이 힘들고 위안 받고 싶어 저러는 구나’라고 머리 속으론 알면서도 마음이 따듯하게 잘 덥혀 지지 않아 빨리 안아주지 못하는 옹졸함이 원망스럽기도 하다.
육아는 단순히 아이만을 바라보고 아이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아내를 이해하고 아기의 성장을 이해하고 나를 알고 다독거리고 것이 매우 중요한 ‘가족의 관계를 키워가는 과정’이란 생각이 든다. ‘아이를 잘 키우려면’ 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지 않는 육아.
용두사미의 어설픈 깨달음에 좋은 가족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려는 누구의 남편이자 아빠의 반성이라 생각하시길 바란다.
참 부모님들은 존경스러운 존재다.
문경환(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