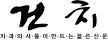유은경은 충청도 산골에서 태어나 자랐다. 아버지에게 받은 DNA덕분에 자연스레 산을 찾게 되었고 산이 품고 있는 꽃이 눈에 들어왔다. 꽃, 그 자체보다 꽃들이 살고 있는 곳을 담고 싶어 카메라를 들었다. 카메라로 바라보는 세상은 지극히 겸손하다. 더 낮고 작고 자연스런 시선을 찾고 있다. 앞으로 매달 2회 우리나라 산천에서 만나볼 수 있는 꽃 이야기들을 본지에 풀어낼 계획이다.
- 편집자 주

첫인상은 참 작다는 것과 작으면서도 ‘어쩜 그리 똘망스러울까’하는 거였다. 그 작은 몸 구석구석을 맘껏 열어젖히고 가을 하늘의 기운을 한껏 받고 있었다. 뿌리 쪽 가까이에서 납작하게 퍼져서 난 뾰족뾰족스런 잎은 어찌나 앙증스러운지. 다육이와 느낌이 비슷하다.

전체 모습은 하얀색이지만 간혹 사랑스런 분홍빛 꽃도 보인다. 다섯 장 꽃잎 끝에 분홍빛을 머금고 있는 하얀 꽃의 매력 포인트는 열 개의 수술 끝에 매달린 자줏빛 꽃밥이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 바위지대에서 볼 수 있다. 보통 바위솔보다 ‘좀’ 까탈스러워 바람이 잘 통하고 비교적 온도가 낮은 곳에 산다. 그래서 ‘좀바위솔’이라고 불렀을까? 그것은 아니다, ‘좀’은 ‘작다’는 뜻이다.

‘애기바위솔’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난쟁이바위솔도 별명이 애기바위솔이기에 정명으로 불러야 한다. ‘솔’이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는 꽃모양이 소나무 수꽃을 닮았기 때문이다.

올 봄과 여름에 걸친 긴 가뭄을 견디고 겨우 몸을 일으켰더니 한여름의 물난리를 만났다. 이 한가로운 푸르른 가을을 맞이하기까지 굽이굽이 많은 고비를 지났다.

좀바위솔을 생각하면 만나러 들어가던 1km 남짓한 단풍길이 겹쳐진다. 둘도 없을 잊지 못할 황홀한 기억이다. 그 길은 곧 만나게 될 좀바위솔에만 집중하고 있던 내게 과정 속에 숨어 있는 행복과 기쁨도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를 전해줬다. 행복은 목적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울 수 없는 짙은 붉은색으로 물들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