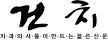유은경은 충청도 산골에서 태어나 자랐다. 아버지에게 받은 DNA덕분에 자연스레 산을 찾게 되었고 산이 품고 있는 꽃이 눈에 들어왔다. 꽃, 그 자체보다 꽃들이 살고 있는 곳을 담고 싶어 카메라를 들었다. 카메라로 바라보는 세상은 지극히 겸손하다. 더 낮고 작고 자연스런 시선을 찾고 있다. 앞으로 매달 2회 우리나라 산천에서 만나볼 수 있는 꽃 이야기들을 본지에 풀어낼 계획이다.
- 편집자 주

호랑이를 찌를만한 가시라는 뜻의 '호자(虎刺)'를 이름에 넣고 있는 것은 가시 많은 호자나무의 꽃과 비슷하다는 단지 그 이유 때문이다. '덩굴'에서 보듯 나무가 아니고 풀이며 다년생이다. 호자덩굴속(屬)에는 전 세계에 2종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다.

어여쁜 꽃을 만나면 담아둘 수 없는 벅찬 감동으로 버거울 때가 있다. 호자덩굴이 그랬다. 그것은 한없이 보드라울 것같은 솜털로 맘껏 치장한, 분홍빛이 살짝 스친 속살을 들여다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느낌이다 .

외로워서일까. 꼭 쌍을 이루어 꽃을 피운다. 특이한 것은 꽃이 두 종류라는 것이다. 암꽃·수꽃 따로 피는 암수딴그루도 아닌데 말이다. 한 송이 안에 같이 있으나 두 갈래로 갈라진 암술이 길게 삐져나온 꽃과 네 갈래로 갈라진 수술이 머리를 내민 꽃이 있다. 아직 명확하게 발표된 학설은 없으나 암술·수술이 같이 있는 것은 확실하단다. 모양새에 더해 불가사의한 매력이 하나 더 얹혀진 녀석이다.

식물은 대부분 씨앗에서든지 뿌리에서든지 싹이 나고 줄기와 잎이 커가며 꽃을 피우고 다음 세대를 위해 열매를 맺고는 사라진다. 이 싸이클 중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당연히 꽃이 피었을 때이다. 그 화려한 시기는 생에 있어 황금기가 틀림없다. 대부분의 꽃들은 꽃이 지고나면 시선에서 멀어진다.

호자덩굴의 경우는 다르다. 남다르게 피어나는 꽃이 열매도 유별나게 맺기 때문이다. 귀가 쫑긋한 일명 ‘돼지코’라 불리는 한없이 귀여운 빨간 열매가 또 한 번 설레임을 갖고 찾아가게 만든다. 감히 황금기인 꽃시절 뒤에 찾아오는 생의 르네상스기라 불러준다.

두 송이의 꽃이 핀 자리에서 열매는 하나만 열린다. 쌍을 이루어 꽃을 피우는 것은 외로워서라기보다 후손을 만드는 능력이 부족해서였나 보다. 그렇게 '둘이 합하여' 하나를 이루었다는 증거는 확실히 남겨두었다. 뾰족한 삼각형 두 귀가 그 증표다. 빨간색을 잃지 않은 채로 겨울을 나고 간혹 다음 세대가 꽃을 피울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

두 종류의 꽃모양으로 한줄기에서 꼭 두 송이씩, 또 그 둘의 흔적이 또렷한 꽃만큼 예쁜 빨간 열매!! 참 별난 사이클을 갖고 있는, 참으로 별스럽게 어여쁜 호자덩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