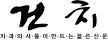이제 전국민건강보험이 시작된 지 30년이 된다. 87년 민주항쟁의 여러 성과 중 하나로 88년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지역가입자의 재정부담을 국가에서 책임지려하지 않아 건강보험은 1989년 7월이 되어서야 전국민이 가입하게 되었다. 당시 보건의료단체와 민중단체들은 전국민건강보험 실현을 위한 국고지원투쟁을 벌였고, 그 결과 노태우정부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부담 50%처럼 지역가입자도 보험재정의 50%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속하고서야 전국민건강보험을 출범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91년 이후 지켜진 적이 없었다. 92년부터 정부는 36.1%를 지원하였고, 이후 98년이 되어서는 24.9%까지 지원율이 추락하게 된다. 국고지원을 줄여나간 여파가 더해져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갔고, 당시 노동,민중단체들은 건강보험일원화를 주장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문제는 2000년 건강보험 통합 이후로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계속 축소하려 했다는 점이다. 2000년 의약분업사태이후 수가인상 등의 요인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자 정부가 겨우 들고 나온 것이 기대수익의 20%가량을 국고지원한다는 한시법안이었다. 기대수익의 20%가량이므로 약속을 완벽히 이행한다면 총재정의 16.6%가 국고부담이 된다. 하지만 이조차 단 한번도 2002년 이후로 지키지 않았다.
건강보험노동조합에 따르면 2019년 국고미지급액도 2.1조원에 이른다. 이 금액이면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폭을 줄여 국민부담을 감소할 수 있고, OECD 국가 중 한국만 없다시피 한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은 단순히 약속미이행 혹은 보험료인상률을 줄일 수 있는 수단만의 문제만이 아니다.
우선 보건의료정책에 국가책임을 강화하라는 시대적 요구와 일치한다. 사실 한국의 건강보험이 직장건강보험으로 시작한 이유는 박정희, 전두환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1972년 의료보험 시범사업의 주된 문제제기가 국고보조금의 현실화였다. 그럼에도 박정희 정부는 국고지원을 하지 않았고, 1977년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기업들에서만 직장건강보험이 시작됐다. 애초부터 국가가 수익자부담형식의 보험제도를 입안하려 한 여파가 아직까지 유지되는 형국이다. 즉 국고지원 방기는 박정희 유산이며, 건강보험의 핵심 적폐다.
국고지원에 대한 약속이행부터 시작해서 국고지원을 늘려야 하는 것은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명확하다. 일본은 계속 국고지원을 늘려 현재는 일본건강보험 총재정의 46%가량이 국고지원이다. 가까운 대만도 몇 년 전 국고지원을 총재정의 33% 이상으로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만은 그전에도 26% 이상의 국고지원으로 보험재정을 운영해왔다. 이외에도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나라 중에 한국보다 낮은 국고지원율을 유지하는 나라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강제가입방식을 유지하는 스위스정도 뿐이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국가가 100% 보건재정을 지원하는 국가보건체계(NHS)까지 운영한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방향의 진정성도 국고지원 미지급과 부딪히면 의심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 건강보험을 공정하게 부과하겠다고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정률이고 상한과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역진적이다. 국고는 세율구간이 있고, 법인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애초부터 누진적이다. 누진적인 재정지원전략을 놔두고 정률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만 고치겠다고 하면 건강보험재정건전화 및 보장성강화재원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국고지원을 방기한다면 민간보험과 유사한 수익자부담원칙을 고수하려다 보니 국고지원보다는 부과체계 개편에 열을 올리는 게 아닌지 정부가 답해야 한다.
이처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책임방기는 무려 30여년이 넘은 과제다. 한국의 경제력이 세계 10위를 바라본다고 하고, 개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을 넘는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왜 의료복지제도의 상징 같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고작 65% 수준이고, 공공병원은 5%밖에 안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애초부터 수익자부담원칙을 바탕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전국민건강보험에 걸 맞는 국고지원부터 확립하여 수익자부담이 아니라 공적부담체계로 이행해야 한다.
전국민건강보험 30주년은 미완의 과제가 조금씩이라도 해결되어야 우리 모두 경축할 수 있지 않을까?
*본 논설은 본지의 논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