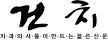그렇다면 치통에 시달리던 우리 선조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최선의 치료법은 무엇이었을까? 아마 자연에서 얻은 약초를 이용하는 방법과 초자연적인 힘에 의지해 고통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적당히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고통의 원인이 되는 치아 자체를 제거한다는 생각은 너무 과격할 뿐 아니라 현실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여겨졌던 것 같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이전의 문헌에서는 발치에 관한 기록을 찾기가 어렵다. 히포크라테스 시대에도 발치를 위해 특별한 기구를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히포크라테스를 계승 발전시켜 이후 약 1500년간 서양의학을 지배한 로마의 의사 갈레노스는, 부식성 있는 약품을 써서 대상치아를 헐겁게 한 다음 손으로 뽑아내는 방법을 권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의학지식을 접하기 어려웠던 민간에서는 보다 확실한 방법을 구했을 것인데 그것은 고통의 원인이 되는 치아를 직접 뽑아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아마 대장장이나 이발사였을 것

이다.
대장장이는 금속을 담금질할 때 쓰는 집게를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언제라도 이와 비슷한 기구를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치통에 시달리던 사람들의 발치 요구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발사들은 머리카락을 다듬고 상처를 치료하거나 피를 뽑아내는 등 사람의 몸에 관계된 일을 주로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치라는 시술을 자신의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발치시술은 도구(대장장이)와 몸(이발사)의 영역이 만나는 지점에서 출발했던 것이다.
이처럼 중세까지의 서양 치과의학에서는 상류층을 대상으로 하는 내과적 치료와 하층민을 중심으로 하는 외과적 치료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리의 벽은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 효시가 우리가 잘 아는 피에르 포샤르다. 그는 ‘도구’의 영역과 ‘몸’의 영역을 ‘학문’의 체계로 결합 발전시킴으로써 치과학을 외과학의 한 분야로 정착시켰을 뿐 아니라, 그 외과학에 체계를 부여함으로써 내과와 대등한 지위로 끌어올렸다.

먼저 드는 생각은, 이 도구들이 치아 주위조직에 얼마나 큰 손상을 주었을까 하는 것이다. ‘키’라는 도구는,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치아 주위의 치조골을 받침점으로 하여 치아에 힘을 가하는 것인데, 마취도 없었던 그 시절에 환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해 보면, 왜 당시의 작가들이나 풍속화가들이 치과의사들을 그렇게 공포의 대상으로 삼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마취술과 소독술이 발전하고 항생제가 발견됨에 따라 이제 발치 수술은 그다지 고통스럽지도 않고 위험하지도 않은 안전한 수술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인의 의식 속에 치과 치료는 고통과 공포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우리의 몸속에는 선조들에게서 물려받은 공포와 고통의 유전자라도 있는 것일까?
강신익(인제 의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