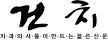옛말에 치아는 오복중의 하나라고 한다. 물론 이 말이 명확한 문헌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얼마나 치아로 인한 고통이 심했으면 건강한 치아를 가지는 것을 부귀영화와 동등한 반열에 올려놓았겠는가 생각하면, 이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치통은 아마도 고통의 대명사쯤으로 여겨졌던 것 같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했을 것이며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문헌에는 치통 관련 기록이 그리 많지 않지만, 유럽의 치과의사학 문헌에는 이런 고통을 표현한 그림들이 무척 많이 남아있다.

<그림 2>는 1993년 <뉴욕 타임스>의 케빈 카터라는 사진기자가 찍어 풀리쳐 상을 받은 사진인데, 굶주려 죽어가는 소녀 곁에 독수리가 앉아서 먹이감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
첫 번째 그림은 작가의 상상력이 포함된 작품이고, 그 속에 얼마만큼의 실체적 진실이 들어있는지를 정확히 말하기가 어렵다. 다만 작가의 눈에 비친 돌팔이와 환자, 그리고 관중의 모습 속에서 당시 치과 의료의 모습을 상상해볼 수 있을 뿐이다.
이 그림에서 고통은 상징이며 환자의 실존과는 전혀 무관하다. 환자의 고통은 동물의 턱뼈로 상징되어 환자의 밖으로 꺼내지고 관중에게 보여진다. 그 순간, 무대위에 있는 고통 속의 환자는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니며 꺼내어져 객체화된 고통에 온 시선이 집중된다.

첫 번째 작품이 현실에 근거한 예술적 상상력의 산물이라면, 두 번째 작품에서는 작가가 고통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작가는 그 장면의 목격자이지만 동시에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또는 하지 않음으로써 그 장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참여자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작가는 풀숲에서 이 장면을 목격하고는 카메라를 설치한 뒤 약 20분 동안 독수리가 날개를 펴기를 기다렸다고 한다. 그래도 독수리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자 이 사진을 찍고는 달려가 그 독수리를 쫓아버렸다고 한다. 이 사진 속의 소녀가 그 뒤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 사진을 찍은 작가가 얼마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고통을 보는가? 소녀의 고통인가? 아프리카 민중의 고통인가? 기아의 현장을 문명인에게 전하기 위해 끔찍한 장면을 목도해야만 했던 사진작가의 고통인가? 아니면 거기에 감정을 이입한 서구인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인가?
두 그림은 모두 어떤 고통을 주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속에 진정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실존은 없다. 다양한 고통의 이미지만이 우리를 혼란케 한다. 첫 번째 그림이 그 고통의 이미지를 동물의 턱뼈라는 실체로 표상하고 있다면, 두 번째 그림에서는 그것들이 개인과 사회와 문명에 분산되어 나타난다.
치과의사는 분명 인간의 고통을 다루는 직업인이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고통이 인간이라는 실존과 사회적·문화적 맥락을 벗어난, 소외되거나 상품화된 고통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강신익(인제 의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