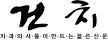오랜 기다림 끝에 만남이었다.
언젠가 황매산 모산재를 배경으로 한 영암사터 쌍사자 석등을 찍은 사진을 보고 내 마음을 쏙 빼앗겨 버렸다. 어서 빨리 가서 보고 싶었다. 하지만 기회는 오지 않았다. 아니 한 번 왔었는데 놓치고 말았다.

지난번 한계사터를 이야기하며 폐사지에서는 여백미를 느낄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하지만 영암사터는 같은 폐사지지만 여백을 허용치 않는다. 이미 절은 오래전에 없어졌지만 남아 있는 훌륭한 유물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황홀한 황매산의 바위봉우리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신령스러운 바위산을 뜻하는 영암(靈巖)을 절 이름으로 택한 것만 보아도 얼마나 황매산의 화강암 연봉이 이 사찰에 있어서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완벽한 아름다운 배산(背山)과 그리고 겹겹이 아득한 산자락을 바라보는 조망등 환상적인 위치 설정이다.
그러한 주변 여견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존재가 바로 금당터 앞의 쌍사자 석등이다.
유홍준 교수는 이를 가리켜 높이 3m가 넘는 석축위에서 마치 황매산 연봉들을 호령하는 대대장 혹은 교향악단의 지휘자 같은 당당함을 지녔다 했다.
하지만 이 쌍사자 석등도 그 자리를 잃을 뻔 했었다. 일제 때 일본인의 반출을 막아내고 면사무소에 있던 석등을 또 다시 제자리로 찾아 세운 것도 마을 사람들의 노력이었다 한다. 제자리를 지킬 때 비로소 그 쌍사자 석등도 또 황매산의 바위봉우리도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훌륭한 문화유산과 그 보다 더 아름다운 산하가 있는 우리나라. 그것들의 완벽한 조화가 이곳 영암사터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박종순(건치 문화기획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