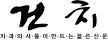연평도에서 주민이 포격으로 죽는 와중에 생뚱맞은 짓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오늘 나는 인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어쩌면 오히려 전쟁이 운위되는 상황일수록 우리는 인권에 대한 처절한 자세를 견지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전쟁을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전쟁이야말로 인권의 바로 가장 핵심인 인간으로서의 존재 자체에 대한 권리 즉 생명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기에 과장하여 말하자면 인권은 전시나 또 다른 어떤 핑계로 제한되거나 유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더 추구하고 관철하여야 할 가치라 하겠다.
그렇다고 내가 인권이 천부의 것이거나 인간이기에 당연히 요구되는 초역사적인 것이라 강변하는 것은 아니다. 인권은 분명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인권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하여서 그것이 상대적인 것은 아니다. 인권은 어떤 상황이란 맥락에서 제한되거나 상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 맥락을 벗어나지는 못하나 그럼에도 그 지향을 관철하여야 하는 보편적인 것이어야 한다. 구성적이기는 하나 보편적인 것으로의 인권, 아마도 그러기에 인권의 문제가 쉽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인권을 이루는 두 글자에서 권(權)이란 글자의 의미가 인권의 법적인 특성, 구성적인 특성을 반영한다면(물론 자연법도 있겠으나), 인(人)이라는 글자는 사회적이면서도 보편적인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인권의 중요 구성은 자유(권)과 평등(권)이라는 권리의 측면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이란 가치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아마 나에게 인권이란 것이 절절하게 다가오는 시점은 인간으로서 나의 존엄이 훼손되는 바로 그때일 것이다. 자유와 평등이란 권리에 인간의 존엄이란 가치가 어우러진 인권 개념의 보편성을 인정하는 한에서 우리는 인권의 가치를 높이고 또한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다. 갑과 을 두 사람에게 돈을 나누어 가지라고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그 돈을 회수하는 실험이다. 이 때 갑이 80을 갖고 을에게 20을 주는 경우, 을의 반응에 대한 설명이다. 많은 경우 을이 그런 배분을 거부하고 한 푼도 못 받는 것을 택한다고 한다.
이를 두고 혹자는 인간 행위의 비합리성의 증거를 찾기도 하고(공돈 20을 포기하기에), 혹자는 인간은 경제적 합리성만이 아니라 정의라는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내 견해는 을의 이런 거부는 을이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존엄의 훼손을 느끼기에 그러한 것이다.
만약 을은 갑이 핸디캡이 있고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갑이 더 많은 필요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을은 평등하지 못한 그래서 정의롭지 못한 배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다고 보고 기꺼이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평화적 정권 교체의 소중한 경험을 한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인권은 약간의 굴곡이 있다 하더라도 순방향으로 보편성을 확장하는 길로 갈 것이라 쉽게 예상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그런 기대는 너무 안이했던 것 아닌가 한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을 가진 국가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가 올 초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하더니만, 것 잡을 수 없도록 악화되고 있다. 자격으로 인해 시민사회에서 반대가 많았던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임명부터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 후 정권의 정치적 관여로 활동이 위축되어 가더니, 이제는 이에 항의하는 상임위원들의 잇따른 퇴진으로까지 이르러 운영자체가 힘들 정도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의 위상이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이것이 기화가 되어 인권위의 변질이 더 노골화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거기에 더해 전쟁의 위협까지 가중되다 보니, 인권위의 문제가 사장되지나 않나하는 걱정이 앞선다.
더군다나 인권위만이 아니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기간의 인권에 대한 성취를 좀먹고 있음을 느낀다. 여성과 동성애자의 인권에 대한 억압적 흐름이 그러하고 비정규직의 인권에 대한 자본과 언론 버팀, 뿐만 아니라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사찰까지도 그러하다. 어쩌면 인권위의 이런 역정은 우리 인권의 우울한 퇴보를 미리 보여 주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해마다 12월은 언제나 인권과 함께 시작했던 기억이다. 올해도 그러할까? 아마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인권이란 문제를 보다 보편적으로 다듬어야할 적극적인 과제뿐만 아니라 점차 우리를 옥죄는 반인권적 흐름을 되돌려야하는 소극적 과제의 중첩으로 우리는 가볍지 않은 시작을 맞을 것 같다.